보험료 차등 인상에 불만 고조.. 자동조정장치 도입 두고 여야 대립 격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특정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연령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이는 오히려 ‘일부 세대만 구제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또 다른 핵심 사안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형평성 맞추려다 “더 꼬였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전 세대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1997년생~)는 매년 0.25%포인트(p)씩 16년간 인상, ▲30대(1987~1996년생)는 0.33%p씩 12년간, ▲40대(1977~1986년생)는 0.5%p씩 8년간, ▲50대(1967~1976년생)는 1%p씩 4년간 오르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을 천천히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연령대별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세대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생(40대 그룹)은 불과 1년 차이로 1987년생(30대 그룹)보다 더 빠르게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보험료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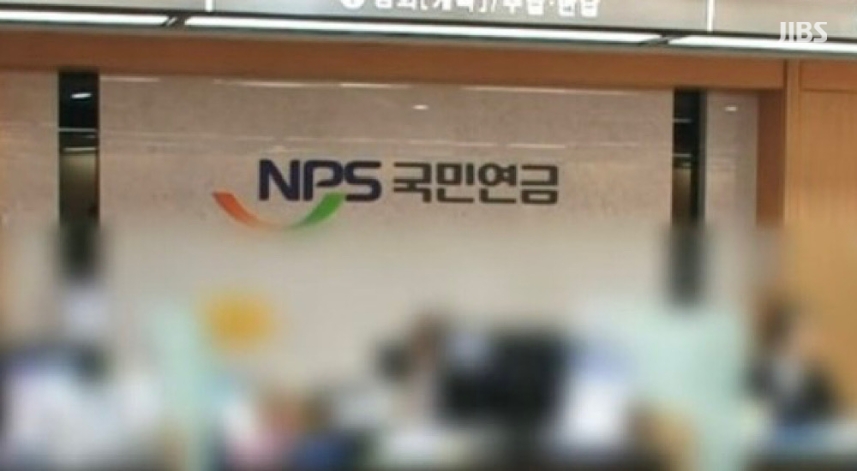
21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40~50대 경계인 1976년생의 경우 연 1%p 인상을 0.666%p로 조정하고 30~40대 경계인 1985·1986년생은 0.5%p에서 각각 0.49%, 0.4%p, 20~30대 경계인 1996년생은 0.33%p에서 0.285%p 조정 인하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 역시 일부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한 살 차이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 삭감 논란으로 확대
국민연금 개혁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 증가 및 인구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개혁안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연금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되, 소득대체율은 43%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되 소득대체율을 44%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연금 개혁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 연금개혁, 야당 단독 강행 처리 가능성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험료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체되면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 없이 개혁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부가 특정 연령대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부분적 수정안’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계속되면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연금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회전으로 끝날지에 대해선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면서도 ”연금개혁이 실질적 대책 없이 ‘정치적 거래’에 그친다면,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png)
.png)